요즘 간도의 기독인들에 대해 공부하는 문순님 때문에 오래 전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 일을 많이 기억해내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흑백사진에 들어있는 내 어린 시절 모양도 신통하게 보게도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동연이만 한 아이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사진이 된 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에 제일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할머니가 계셨고 할머니 치마폭에 담겨있었던 어린 내가 서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치마에 닿아있었던 부드러운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사진을 나눠가지신 분들 거의 모두가 저를 알아봐주셨을 것이라는 귀한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어야 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 곁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늙은이의 삶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 “그래, 맞아. 나도 꽤 오랜 세월을 지나며 살아왔구나!” 싶어집니다. 계간지 <니>에 ‘기억 속의 니’라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이 적 사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얼마 되지 않은 사진들이지만, 자기의 어린 시절 사진이 잊었던 기억을 되살릴 뿐 아니라 니들이 그 때는 모르고 있었던 삶의 품과 결을 새롭게 깨닫는 글이 실립니다. 글 쓰는 니나 읽는 니들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글이라 매번 소중하게 챙겨 읽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지내온 삶의 자취는 어느 때고 정말 소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 동무의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한 적이 없었던가요? 이제 부모가 되어 다른 집 아이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짓을 하는 내 아이를 마음속으로 바꿔치지 하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친구 남편이 더 훌륭해 보이고 다정해 보여 부럽고,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 자기마음대로 휘둘러대고 싶어하지 않았나요? 자기 삶 뿐 아니라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삶의 경로를 모두 의미심장하게 인식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삶의 역사는 ‘타임머신’을 타고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소중한 삶을 마구잡이로 살아버리려 합니다. 술에 취해 기분내며 좋아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보람 있는 일을 피해가며 지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듯 보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대치해주지 못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며 살려 듭니다. 옷이나 화장 같은 겉치례를 흉내내는 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삶을 주름잡을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인기 순으로 합니다. 허기야 결혼 중매하는 데에서도 직업에 따라 인기 순으로 줄을 세운다지요.
이렇게 하루, 한주, 한 달, 한해, 매 순간을 차곡차곡 살고 우리 누구나 늙어갑니다. 늙은이가 되어 다시 갓난 아이로, 어린 시절로, 학생으로, 젊은이로, 자녀 양육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냥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전체의 판도가 늙은이의 여기, 그리고 오늘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역사만으로 늙은이의 ‘여기’, ‘이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 다 우리 역사의 판도를 그려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늙은이와 함께합니다. 더 넓은 이웃을 품고 살아왔다면 그 넓은 이웃들과 함께 갑니다.
자수성가해서 물질로 풍성하게 곡간을 채우고 “이제 편히 살리라“ 했는데, 정작 죽음을 앞두게 된 늙은이가 혼자 죽기를 억울하다 합니다. 그러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널리 이웃과 살려 하고, 그렇게 삶을 일구고 세워온 늙은이는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고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선배들과 후배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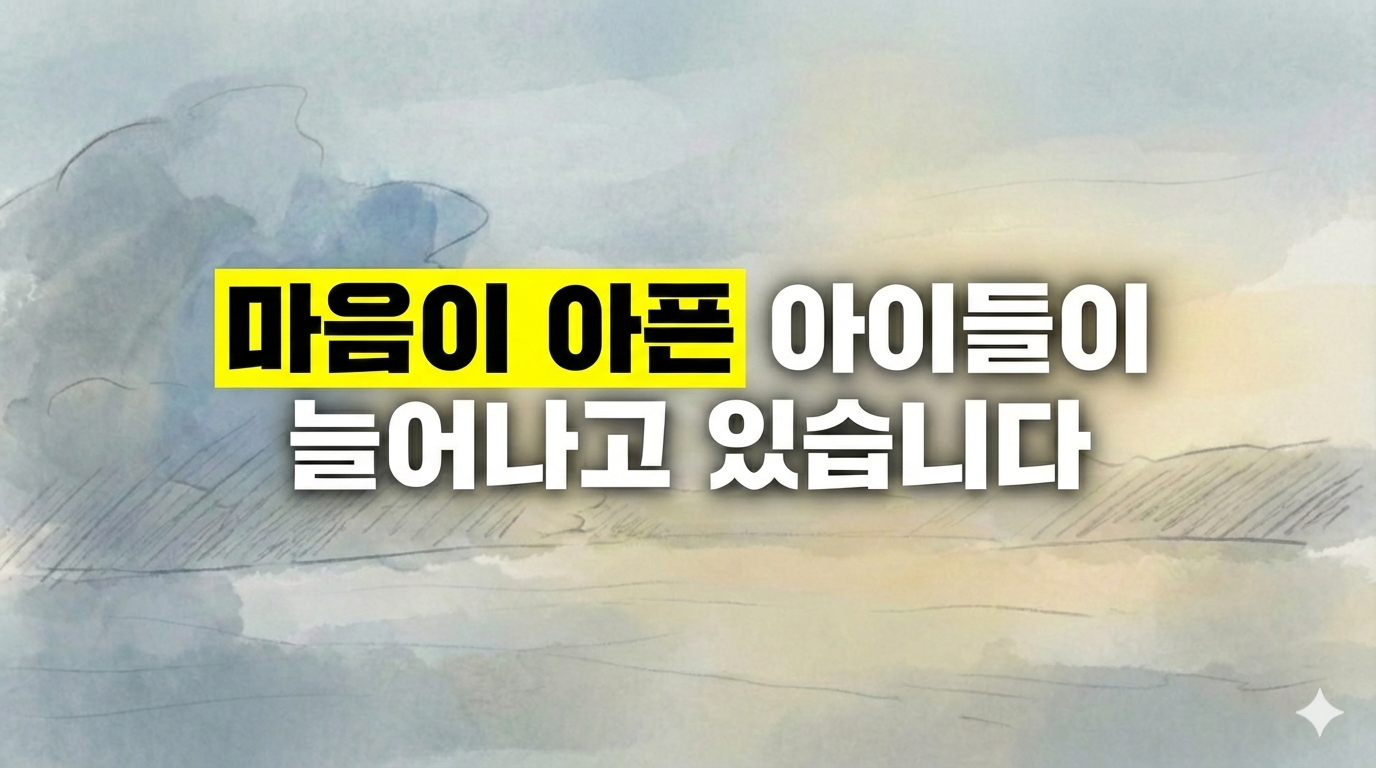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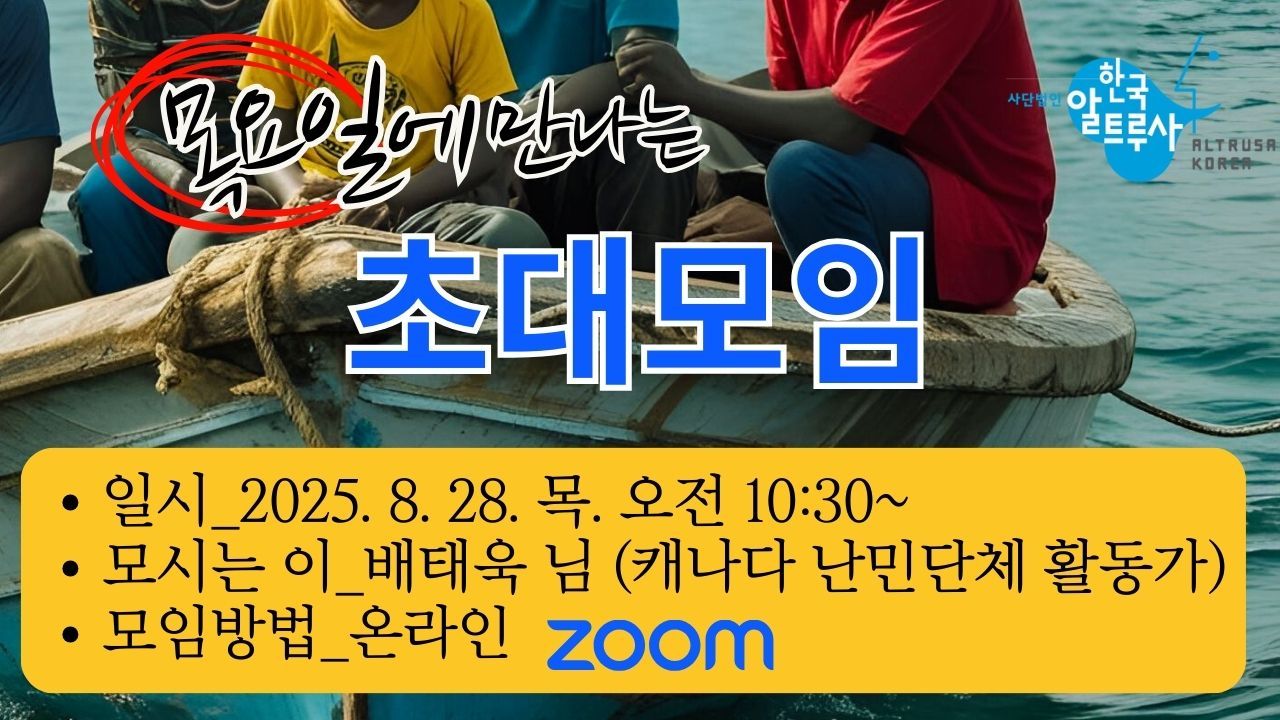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