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 소식지(247호)
<코로나19 시대, 우리 이야기>
씨앗 편지
이경희
신혼집에 처음 심었던 메리골드 씨앗은 친정집 담 밑에서 얻어 온 것이었다. 작은 요플레 통에 심었는데 새싹이 많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가 잦았는데 그때마다 씨앗 심기는 특별한 의식과 같았다. 새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가듯, 씨앗도 나와 같은 처지로 새집에 심어지고 자리를 잡았다.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씨앗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었다.
시골로 이사 온 지 2년 차에 코로나 시대를 맞았다. 타지에 와서 한참 마음 몸살을 할 때, 지인이 꼬깃꼬깃 접은 하얀 종이에 넣어 준 허브 딜, 금어초 씨앗은 내게 보내는 꽃 편지였다. 심으면 잘 자라서 예쁜 꽃을 보여줄 테니까. 씨앗을 처음 심을 때는 무척 설렌다. 씨앗을 심는 용기는 특별할 것이 없다. 어떤 통이든 괜찮다. 통 아래로 물구멍을 하나 뚫어주고, 흙을 채워 준다. 맘에 드는 씨앗을 골라 뿌려주고서 흙을 덮는다. 마지막으로 물을 준다. 아! 작은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은 귀찮아도 잊지 말 것. 요즘같이 시원한 날씨엔 해가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둔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갈수록 언제 나올지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다 무심히 어느 날 쏘옥 고개를 내민 연두색 새싹을 마주할 때 난 나지막이 탄성을 지른다. “안녕, 반가워!” 몇 날 며칠을 새싹과 사랑에 빠진다. 앙증맞게 자라나는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탄한다. 나를 지켜보던 초6 아들이 말했다.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라.” “그래, 그렇지? 미안!”

알트루사가 예쁜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기뻤다. 한옥 마당에 예쁜 꽃이 아기자기하게 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씨앗 편지를 보냈다. 언젠가 그 꽃을 보는 이들이 새 힘을 얻길 바란다. 씨앗은 딱딱한 껍질이 썩어야 비로소 새 생명을 만날 수 있다.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예쁜 꽃밭이 되듯, 우리 마음의 꽃도 활짝 피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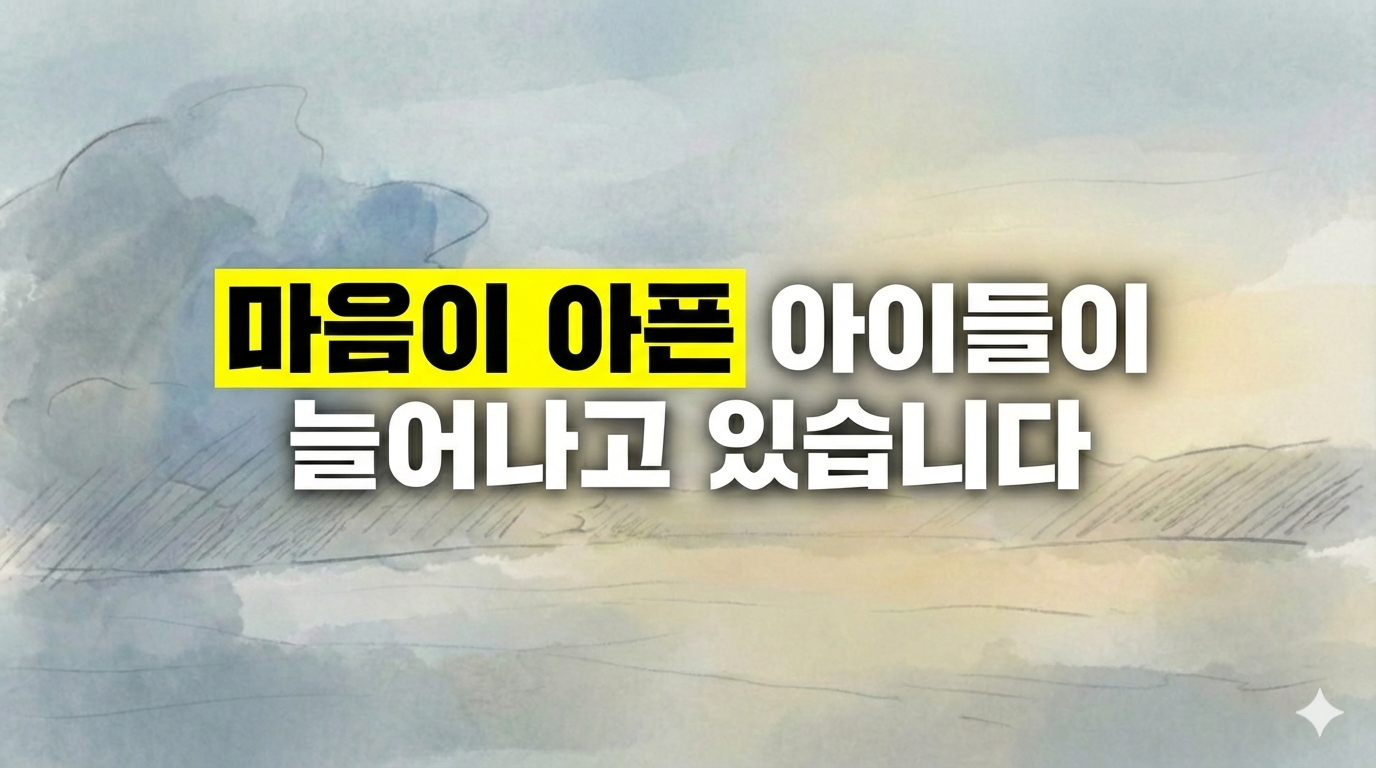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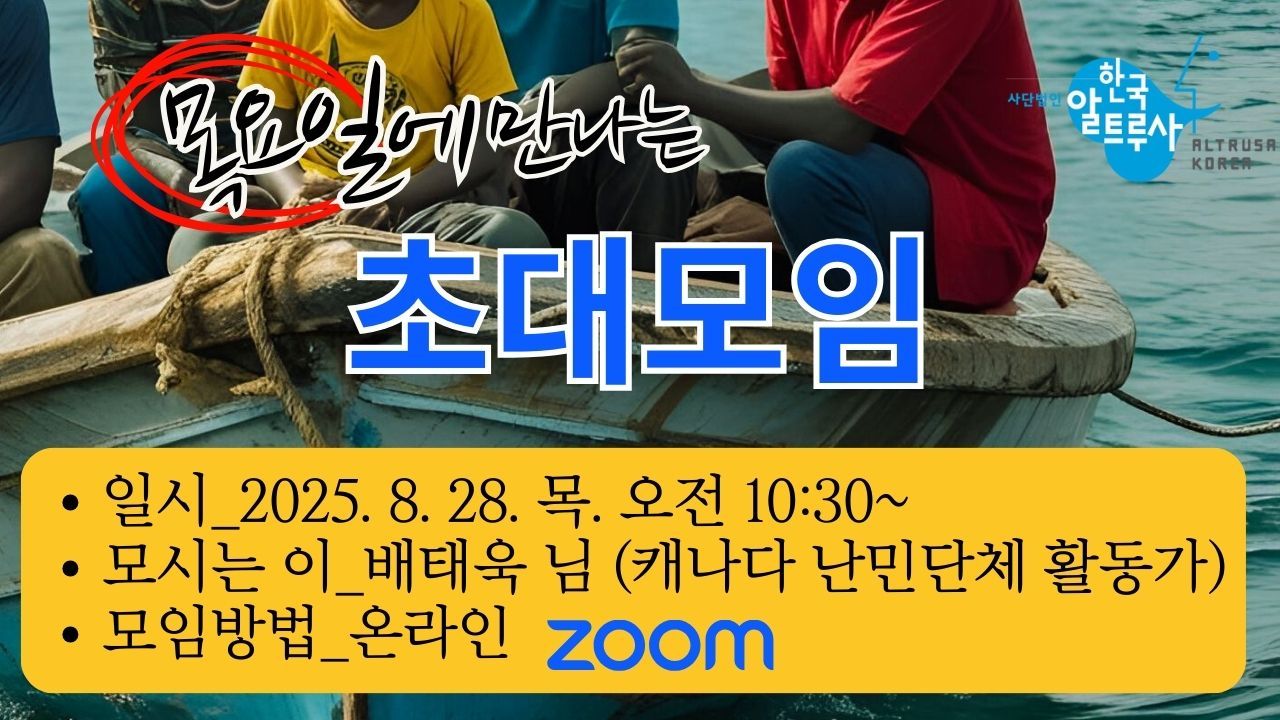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