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 소식지(252호)
<코로나19 시대, 우리 이야기>
코로나 시대의 제주살이
윤들
제주도에서 ‘육지 며느리(제주도에서는 바다 건너 한국을 ’육지‘라고 부른다)’로 산 지 2년 반이 되어간다. 2020년 4월에 귀국하면서 제주도 시댁에서 짐을 풀었을 때는 잠깐 얹혀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생각보다 제주살이가 길어지게 되었다.
남편이 육지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방식으로 시댁에서 계속 살기로 정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표 값이 고속버스표만큼이나 싸져서 무리해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그 편이 할 만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여러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되어서 덕분에 제주도에 살면서도 알트루사 모임이나 전에 다니던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의 마지막 단계에 추가배송비를 결제하는 순간 말고는 평소에는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제주살이가 좀 격리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하나 있다.
언젠가부터 규정이 사라졌는데, 꽤 최근까지도 제주도에서는 ‘육지’를 다녀온 사람에게 격리를 권했다. 섬이다 보니 규정이 엄격한 것 같은데,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꽤 많이 불편한 규정이었다.
육지를 다녀온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친정을 다녀오려면 방문 이후 아이를 학교에 며칠 안 보낼 마음을 먹어야 했다. 그리고 육지에 다녀온 뒤에는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 육지라는 해외(?)를 방문할 때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제는 제주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고 방역 준칙도 바뀌어서 위와 같은 불편함이 어느새 ‘라떼는 말이야’같이 여겨지기도 한다. 코로나 시절의 경험 모두가 ‘라떼는 말이야’같이 들리는 날도 어서 왔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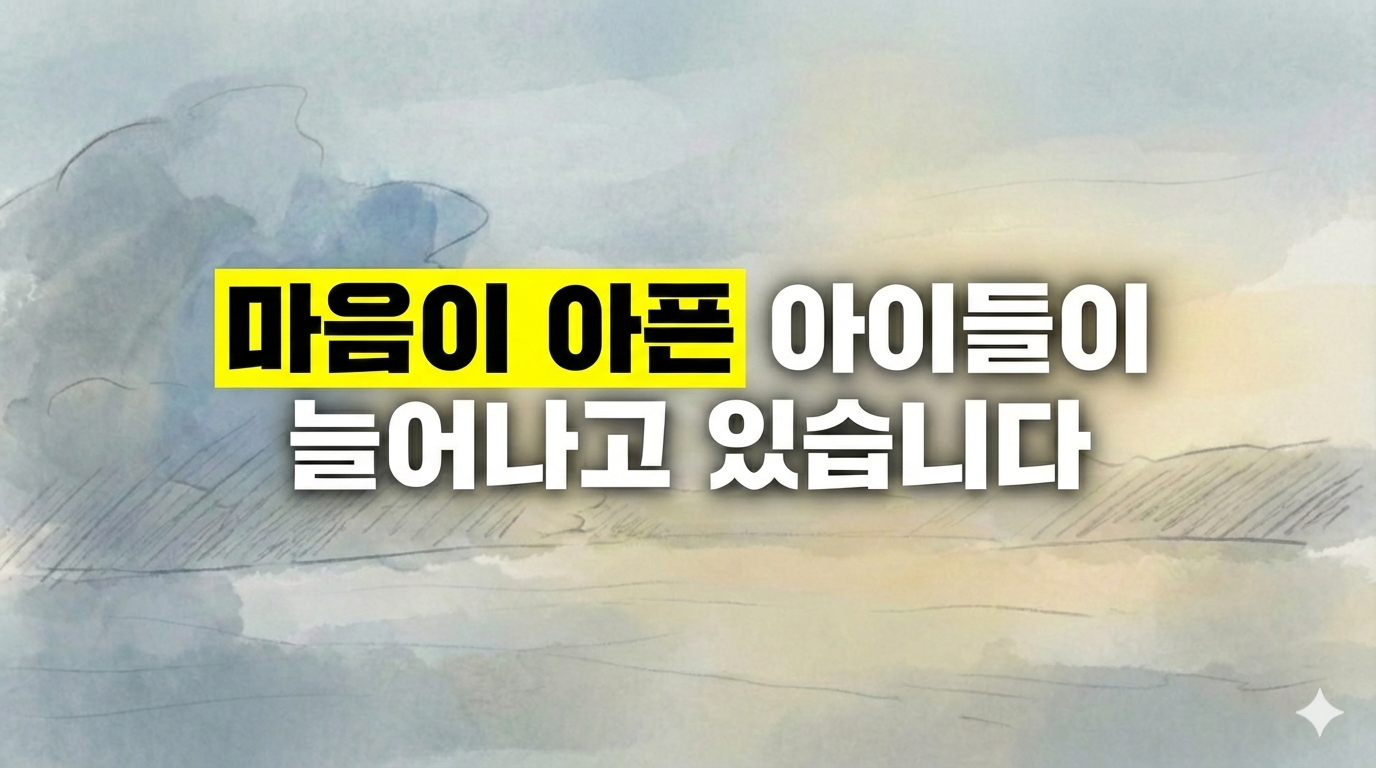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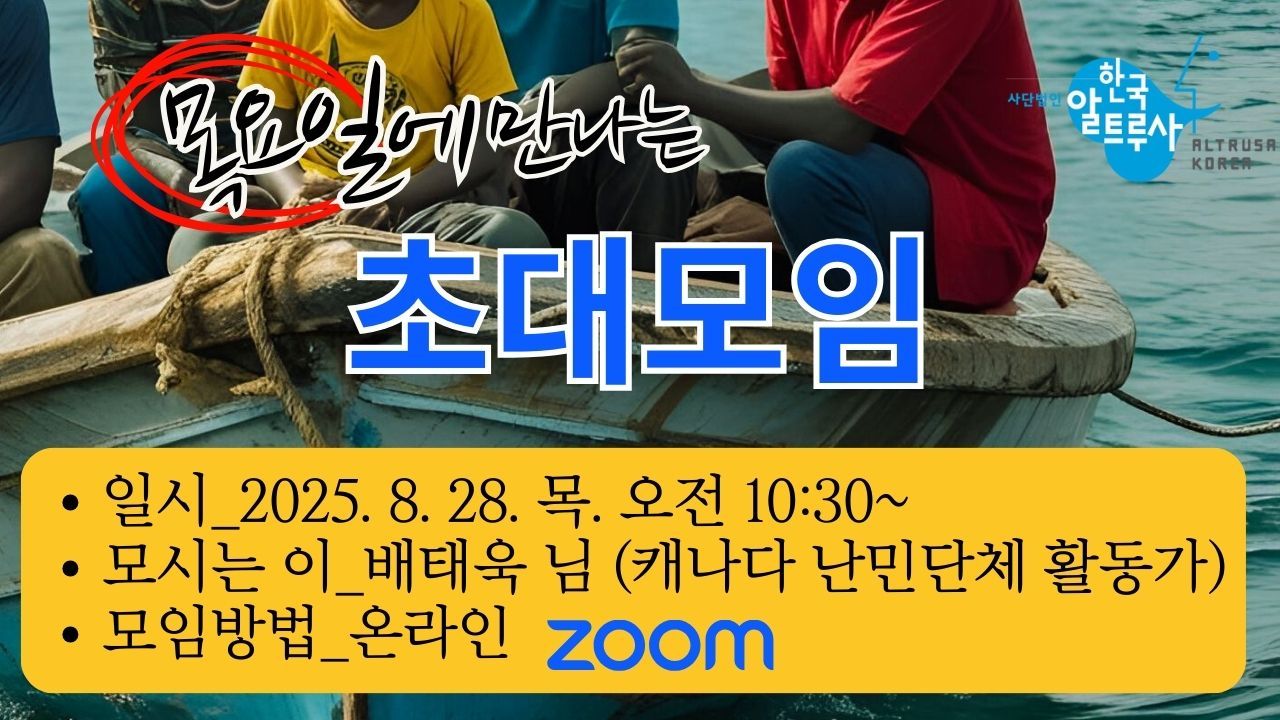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