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소식지(255호)
<이웃과 함께 사는 이야기*>
디미뜨라와 H
이정연
2016년, 남편이 일하고 있는 그리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넓은 정원이 있고 공동 수영장이 있는 분에 넘치게 아름다웠던 집, 그러나 첫날부터 옆집에서 축구공을 바닥에 튕기는 소음이 멈추질 않아 날마다 무척 괴로운 날들이었다.
며칠 후, 나는 금세 옆집 엄마 ‘폴라’와 친해지게 되었다. “내 딸 디미뜨라는 autism 이야” 라고… 난 단어의 뜻을 몰라 사전을 찾아보니 ‘자폐’였다. 비로소 소음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이다.
폴라는 방학이 되면 자신의 정원에 놀이학교를 만들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놀이 선생님도 초빙하였다. 그러나 디미뜨라는 단 한 번도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난 폴라에게 물었다. “디미뜨라가 참여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하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다. “10여 년 전, 처음 시작할 땐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몇 년 지나자 거실에서 쳐다보고 있었고, 또 몇 년이 지나자 정원까지 나와서 바라보고 있었어.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는 거지.”
더욱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다. 서슴없이 디미뜨라와 부딪치며 함께 뒹굴었고, 수영장에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디미뜨라에게도 물장난을 쳐댔다. 전혀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난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 한없이 부럽기만 했다.
몇 년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교회에서 ‘H’를 만났다. 그녀는 발음이 어눌한 약간의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이었다. 어느 날 기회가 생겨 그녀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날 ‘언니’ 하며 잘 따랐다. 하루는 그녀의 지난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듣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땐 놀림을 많이 받고 모두 자기를 피해 상처가 컸다고 한다. 그리고 8년 전, 누군가의 권유로 장애등급을 받아 취업을 하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놀림거리가 되었고, 심지어는 누가 자기 배를 보고 임신했냐고 놀려서 이를 악물고 20㎏을 뺐다고 한다. 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의식적으로는 너무 후진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내 삶에서 디미뜨라와 H와의 만남은 행운이다. 그들을 통해 천사의 모습을 보았고, 장애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그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인을 만나더라도 난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친구가 되는 평범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평범함’이란 걸 알게 해주었기에…
* <이웃과 함께 사는 이야기>는 이번 호에 처음 생긴 꼭지이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다.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알트루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우리는 알트루사에서 나를 분명히 알고 나와 다른 이웃을 이해하며 함께 살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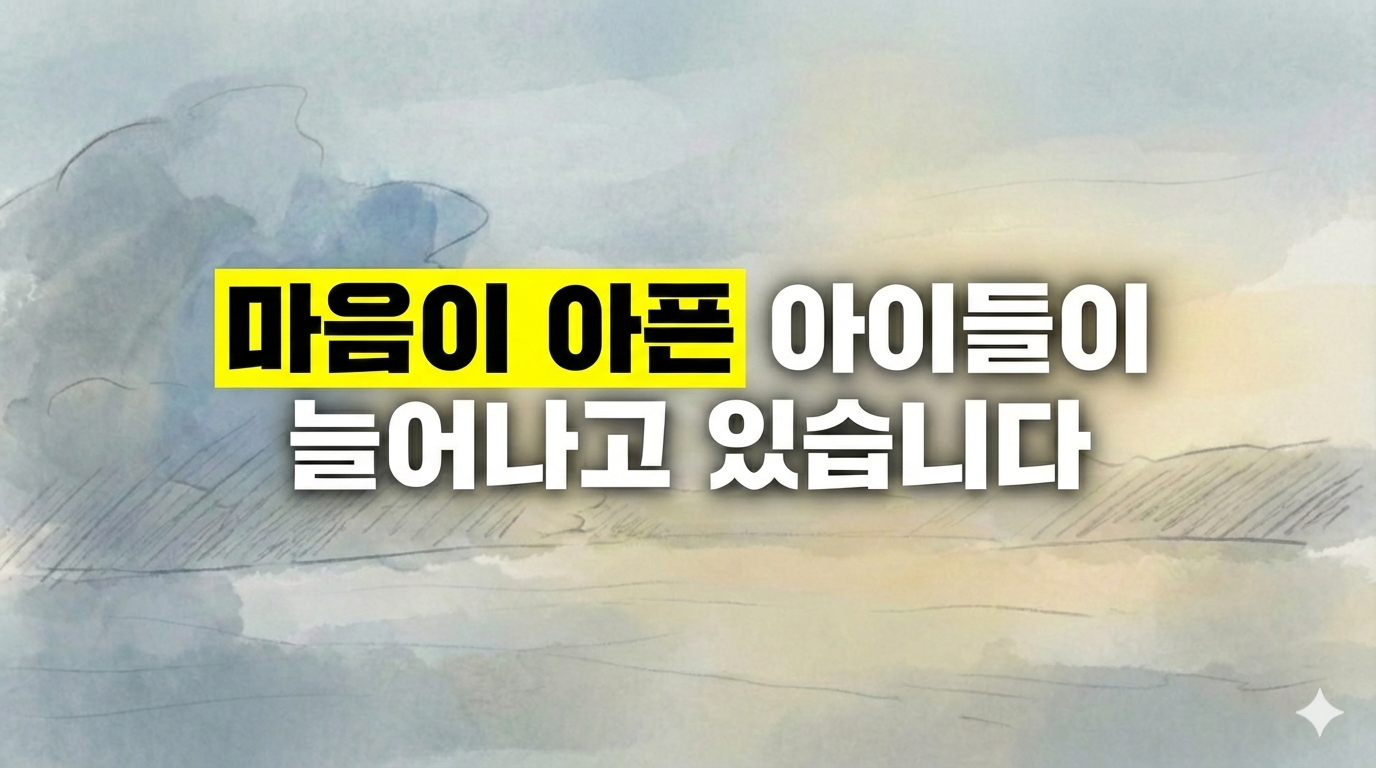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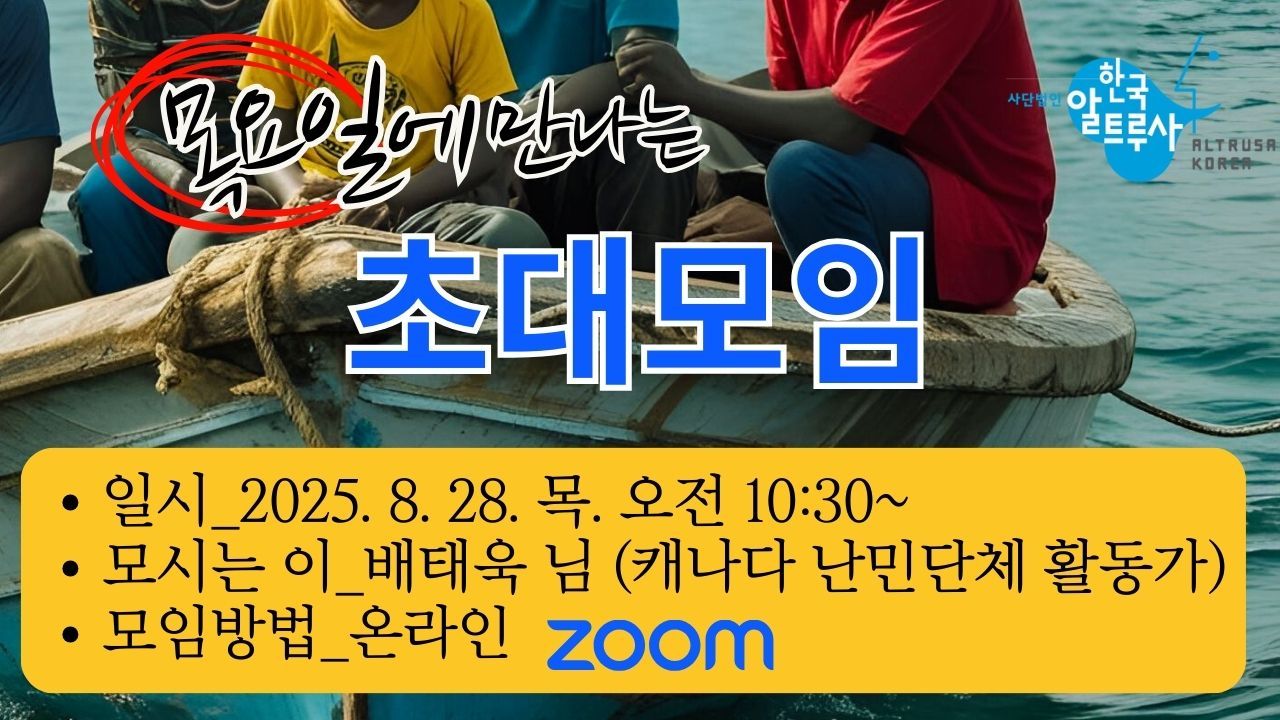





Comments